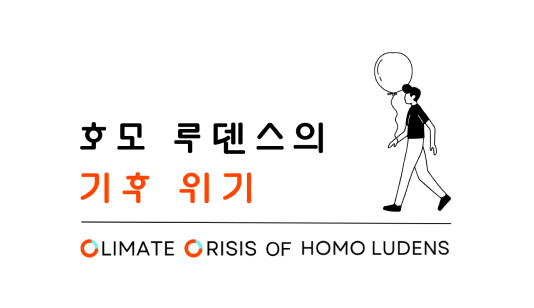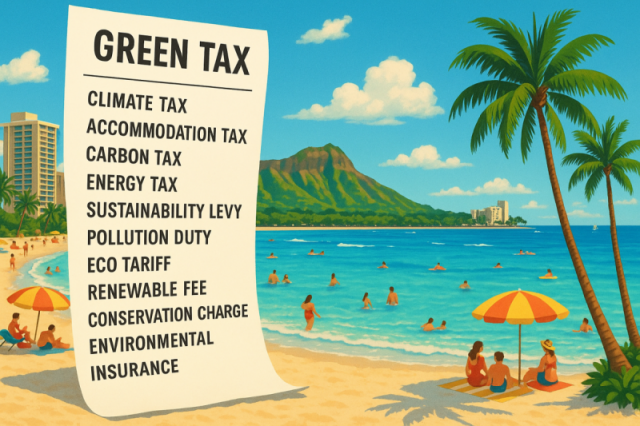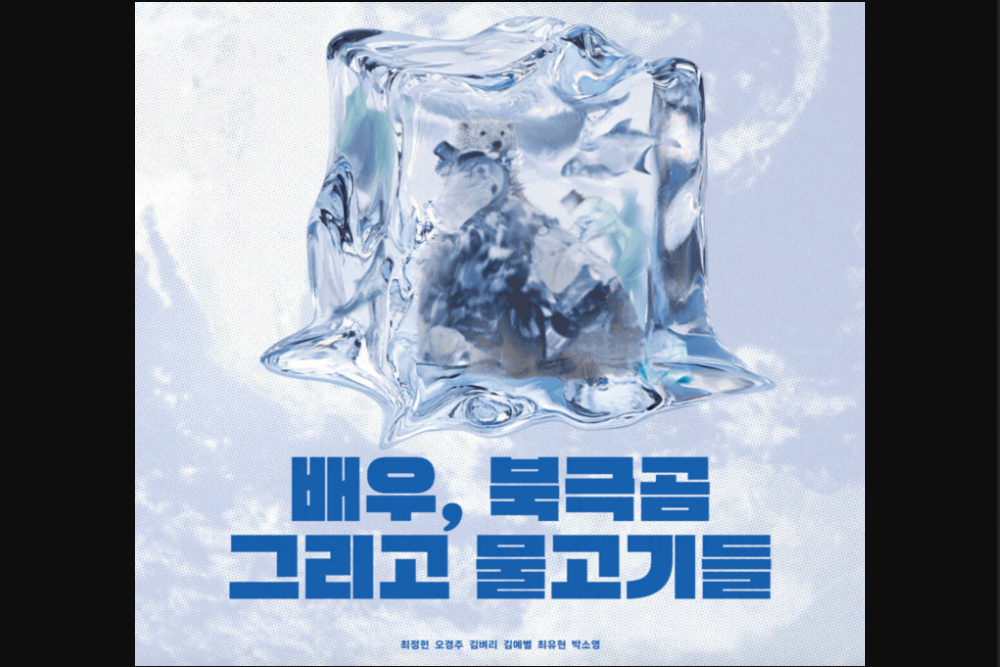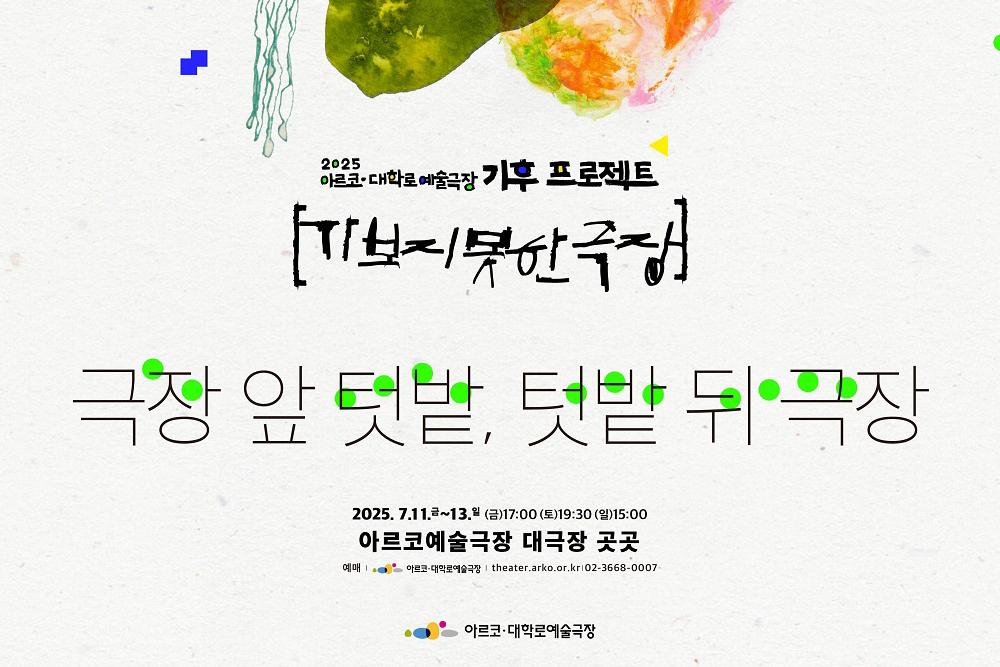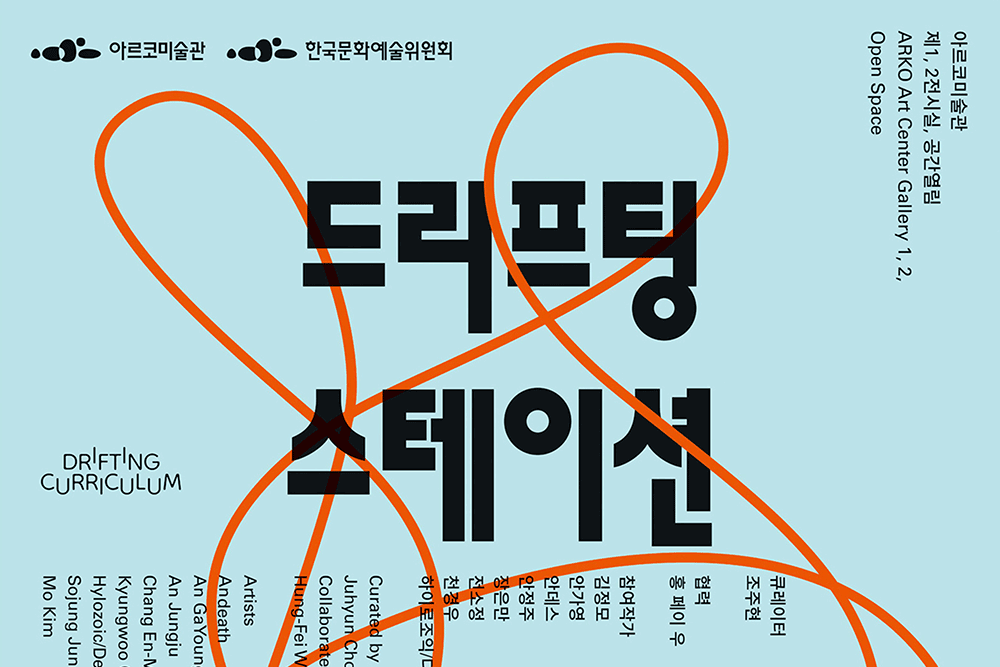영화 ‘설국열차’에 등장한 단백질바의 정체에 모두가 기겁했다. 곤충, 그것도 더러운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시각적·미각적 아름다움을 완벽히 제거한 ‘까만 덩어리’는 인간의 먹는 행위를 오로지 생존의 수단으로 퇴화시켰다. 그것은 미식의 즐거움과 권리를 강탈한 심각한 폭력의 묘사였다.
바퀴벌레를 사육해 단백질바를 만드는 과정은 얼핏 생각해도 탄소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일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식의 미래가 까만 덩어리일 리는 없다. 미식의 즐거움과 탄소중립을 조화시킬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탄소중립과 미식, 그들의 불편한 관계
양념 장어구이, 육회와 캐비어, 해삼·전복·삼계를 넣은 탕, 한우 갈비찜.
입안에 군침 돌게 하는 국내 한 미슐랭 식당의 요리들이다. 소고기, 전복, 장어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먹거리지만, 이것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은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특히 소고기는 1kg을 생산할 때 약 100kg CO2eq이 배출되는 온실가스 다배출 식재료다.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가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 배출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채식재료라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를 개발하고, 많은 비료와 살충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세계 벼농사의 메탄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추정한다.

모든 식재료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식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식재료의 운송과 포장, 유통에서부터 조리, 음식물 쓰레기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식 분야에서 탄소중립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부터 줄여볼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식당 ‘사일로(Silo)’는 세계 최초로 ‘제로 웨이스트’ 원칙을 도입해 탄소감축을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의 ‘그린 스타’를 획득했다.

사일로의 주방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조리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식재료의 모든 부분을 식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가령 구운 빵에서 잘라낸 딱딱한 겉면은 버리지 않고 후식용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식으로 메뉴들을 새롭게 개발했다. 식탁에 올릴 수 없는 채소의 껍질, 뿌리 등은 따로 모아서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한다. 그러면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선 파인다이닝의 특성상 적정량의 음식만 제공하기 때문에 남는 음식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폐기해야 하는 음식물과 식재료가 발생하면 미생물 처리기에 넣어 퇴비로 만든다. 핵심은 그다음인데, 이렇게 만든 퇴비는 식당이 직거래하는 지역 농부들에게 다시 제공한다. 제로 웨이스트 식당이 구축한 소규모의 지역 자원순환 시스템이다.
식당에서 줄일 것이 음식물 쓰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식업계의 엄청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생각하면, 식당에서 ‘제로 플라스틱’을 실현하는 것 역시 미식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넷플릭스 방송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모았던 셰프 에드워드 리는 플라스틱 없는 지속가능한 레스토랑을 실험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비영리 한식당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문을 열게 될 이 식당은 손님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식당 내에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식자재 공급망 전체에서 제로 플라스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한 혁신, 어디까지 갈까?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해서는 제로 웨이스트와 제로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식재료의 변화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식단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은 진작에 넘어섰다. 이제는 기술 개발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식재료의 혁신이 화두다. 바야흐로 미식 산업은 첨단 기술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육식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법 대신에 육식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육을 개발하는 것이 그 일례다. 대체육에는 콩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밀글루텐, 쌀, 감자, 버섯 등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고기의 맛과 질감을 재현하는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제품 종류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식물성 대체육 개발 업체인 비욘드 미트(Beyond Meat)의 제품을 보면 버거 패티 말고도, 소세지, 미트볼, 육포 등 다양하다. 2022년 글로벌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80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에 이르며, 2027년에는 150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체육 시장의 핫이슈는 단연 ‘랩그로운 미트(lab-grown meat)’, 즉 배양육이다. 동물에서 근육과 지방 조직을 추출해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만든다. 실제 세포를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처럼 붉고 먹음직스럽게 마블링까지 되어 있다. 이 실험실 고기는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80~90% 가까이 획기적으로 줄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짜’ 고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내기보다는, ‘진짜’ 자연물로 만든 새로운 대체재를 제안한다. 고정관념을 깨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신세계다. 바로 식용 곤충이다. 식용곤충을 누가 먹나 싶지만, 2024년 전 세계 식용곤충 시장 규모는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원)로 추산되며, 앞으로 10년 내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식용곤충도 그대로 소비하기보다는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재가공 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식용곤충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멕시코, 태국, 인도, 콩고, 중국 순이다. 국내에서는 벼메뚜기, 누에 유충번데기,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의 10종이 식용곤충으로 등록되어 있다. 식용곤충이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한 열쇠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고단백 식품이면서 비용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곤충은 가축에 비해 사육 면적이 적어 토지 이용 효율이 높고 사료도 적게 들며, 세대 순환이 빨라서 짧은 시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게다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의 비중이 닭이나 돼지의 경우 55%, 소는 40%인데 반해 곤충은 80%로 높다. 그 결과 갈색거저리의 경우 1kg당 같은 무게의 돼지고기 대비 온실가스를 1/10 밖에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50% 이상으로 높고, 불포화지방산, 칼슘,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풍부해 대체식품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좋은 대체재라고 모두 장밋빛 전망은 아니다. 남들이 다 잘 먹는 식재료 조차도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뉘는데, 비건 미트나 랩그로운 미트, 식용곤충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일본의 한 혁신적인 제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식품회사 기린 홀딩스가 개발한 ‘일렉솔트’라는 전기 미각 기술을 활용한 숟가락이다. 이 숟가락은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인간의 뇌가 짠맛이나 감칠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입맛을 조절한다. 일렉솔트가 던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미식 분야의 기술 혁신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미각 기술을 통해 만약 설국열차의 바퀴벌레 젤리가 맛있게 느껴진다면 어떤가?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미식의 미래가 그런 모습이라면 제법 떨떠름하긴 하다.

미식은 혀가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식을 추구한다. 그런데 맛에 대한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국에서 즐겨 먹는 꽃게를 이탈리아에서는 돈을 주고 폐기한다니 말이다. 우리는 종종 연어나 망고처럼 멀리서 온 귀한 것, 겨울철 수박처럼 철을 거스르는 것, 제주 다금바리처럼 구하기 힘든 것을 진미로 여긴다. 미식은 혀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식은 문화다. 무엇을 먹느냐 만큼 어떻게 먹느냐 역시 중요하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음식을 남겨야 미덕인 중국의 대접 문화, 적게 먹으면 손해라고 폭식을 부추기는 뷔페 문화, 못생겼다는 이유로 폐기하고 상품성 높은 예쁜 것만 사고파는 현대의 식자재 소비 문화, 이 모든 것이 미식의 일부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미식을 위해서 배양육과 식용곤충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혁신할 수 있는 것은 미식 문화가 아닐까.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새로운 미식이 필요하다.
▶ 이 글은 한국석유공사의 웹진 ‘석유사랑’ 기고글입니다.
https://www.knoc.co.kr/upload/EBOOK/sabo/204/sub/sub2_4.html